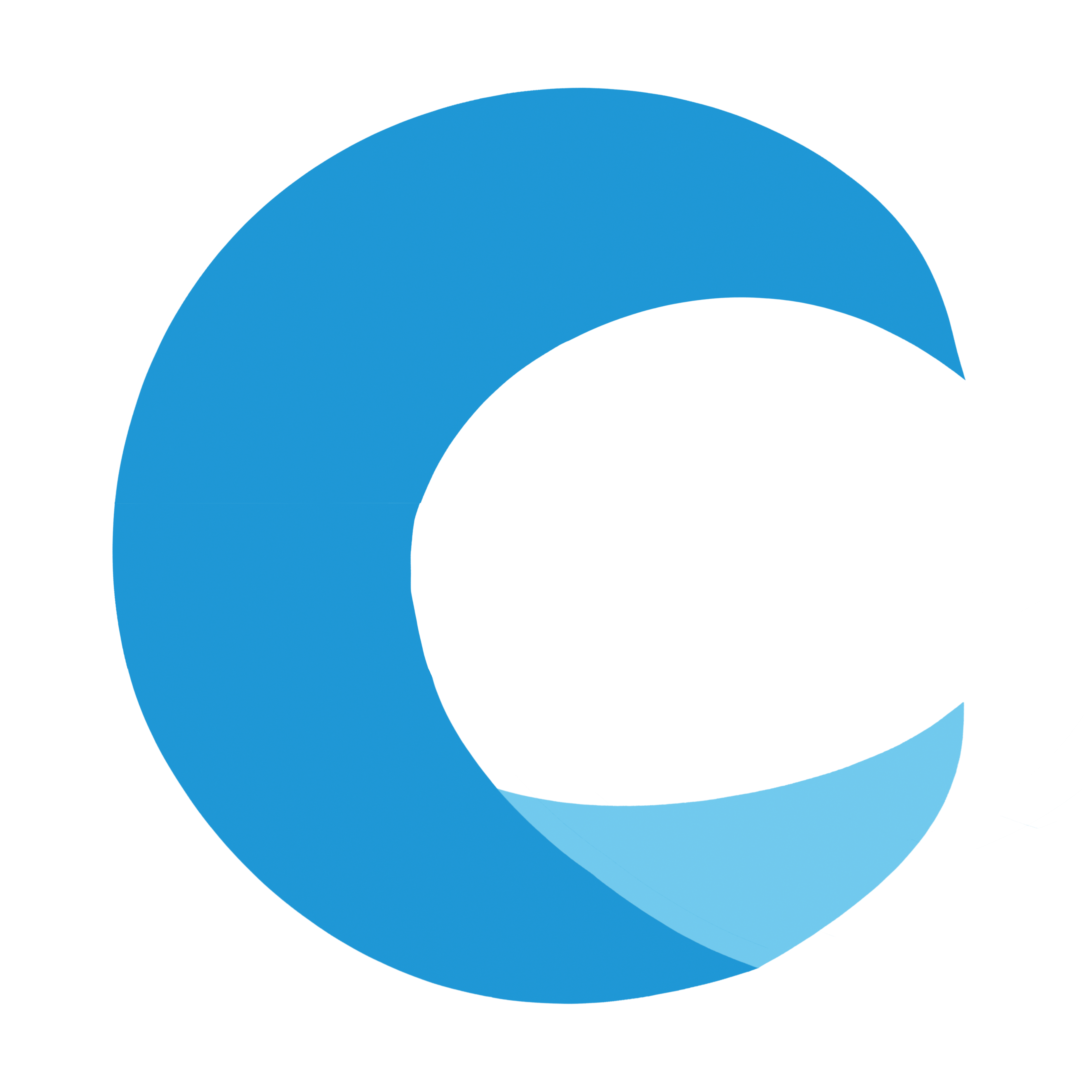[수완뉴스=채진우 칼럼니스트] 한국에서 자랐던 내가 인도에 처음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야말로 문화 충격이었다. 한국인의 눈에는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인도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처럼 굴러가고 있었다. 나는 그 당연함을 이해하려 애썼고, 어느새 나 역시 그 흐름 속에 익숙해져 있었다. 지금은 오히려 한국에 돌아가면, 인도에서 당연했던 것들이 사라진 세상에 어색함을 느낄 정도다.
이 칼럼은 내가 인도에서 겪은 일상 속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국인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인도인에게는 당연한 것들’을 솔직하게 풀어낸 작은 기록이다.
1. 정전은 일상이다
인도에서 전기가 나가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다. 갑자기 불이 꺼지고, 선풍기가 멈추고, 와이파이가 끊긴다. 처음에는 불안했다. “이렇게 자주 정전이 되면 회사는 어떻게 돌아가지?”, “뉴스는 어떻게 보지?” 하는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사람들은 태연하다. 정전이 되면 잠시 멈췄다가, 전기가 돌아오면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일을 시작한다.
어떤 동네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전이 되기도 한다. 그 시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냉장고 문을 열고, 휴대폰 배터리를 충전하고, 선풍기 바람을 최대한 쐰다. 준비하는 것이 당연하고, 기다리는 것도 당연하다.
한국에서는 1년에 한 번 정전이 나도 뉴스에 오르지만, 인도에서는 정전조차 ‘기후’처럼 받아들여진다.
2. 약속 시간은 ‘대략’이다
“12시에 만나자”라는 말은 한국에서는 ‘12시 정각’을 뜻한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그렇지 않다. 대체로 30분~1시간은 여유있게 생각해야 한다. 처음에는 기다리는 시간이 답답했다. 하지만 나중엔 나도 익숙해졌다. 오히려 빨리 가면 괜히 어색해진다. 약속 시간은 일종의 ‘의도된 범위’처럼 느껴졌다.
이러한 시간 감각에는 ‘사람 중심’의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누가 늦는다고 해서 무례하다거나 성실하지 않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 ‘온다’는 사실이지, ‘몇 시에 오는가’는 덜 중요하다. 한국식 ‘정확함’이 성실함이라면, 인도식 ‘느긋함’은 관계와 여유를 중시하는 정서다.
3. 길에서 손으로 먹는 사람들
식당에 가면, 인도 사람들은 밥을 손으로 먹는다. 스푼도 포크도 없이, 오른손으로 커리를 비비고, 밥을 쥐고, 입으로 가져간다. 한국에서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건 어린아이의 행동이나 비위생적인 이미지로 여겨질 수 있지만, 인도에서는 손으로 먹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맛있는 방법이다.
인도인에게 손으로 먹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음식과 교감하는 행위’다. 손끝으로 음식의 온도와 질감을 느끼고, 입으로 들어가기 전 이미 음식과 하나가 된다.
4. 종교는 일상이자 공기다
인도는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 시크교, 불교 등 수많은 종교가 공존하는 나라다. 거리 곳곳에는 사원, 모스크, 교회가 있고, 하루에도 여러 번 기도 소리나 종소리가 들려온다.
한국에서는 종교가 비교적 사적인 영역에 머무르는 반면, 인도에서는 종교가 곧 일상이고 풍경이다. 이곳 사람들에게 종교는 선택이 아니라 정체성이다.
심지어 종교 의식 때문에 교통이 마비되거나, 동물(예: 소)이 도로를 점령해도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은 드물다. 나 역시 처음엔 “왜 소가 도로에 있어?” 했지만, 이제는 평범한 일상으로 여긴다. 믿음의 다양성이 공존하는 곳, 그게 인도다.
5. 예고 없는 친절과 불편함이 공존한다
인도는 친절과 불편이 공존하는 나라다. 낯선 이가 길을 물으면 끝까지 데려다주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지만, 교통은 무질서하고 관공서 업무는 느리다. 누군가는 ‘비효율’이라 말할 수 있지만, 어떤 시선으로 보면 그 안에 ‘인간적인 온기’가 숨어 있다.
한국처럼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나라도 중요하지만, 누군가를 기다려주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태도는 인도에서 더 많이 배웠다.
다름은 불편하지만, 풍요롭다
한국과 인도는 너무 다르다. 처음엔 낯설고 불편했던 그 차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 삶을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주었다. 한국에서는 ‘정답’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인도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 경험은 나를 더 유연하게 만들었고, ‘다름’을 무조건 고치거나 설명하려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이제 나는 어떤 문화든 “왜 저렇게 하지?”가 아니라 “왜 나만 이렇게 생각했지?”라고 되묻는다. 다름은 때로 불편하지만, 결국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자극이다. 그리고 그 자극이 쌓일수록, 우리는 더 넓은 사람이 된다.
채진우 칼럼니스트